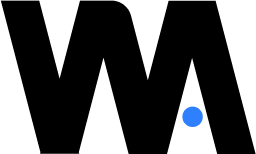완전 자율주행이라더니 ‘문’ 때문에 멈춰... 3만원 알바 등장
건당 20달러 보수에 틱톡 조회수 40만회 폭발
기술의 발전이 만든 아이러니, 결국 해결사는 ‘사람’

슬라이딩 도어를 탑재한 지커믹스 / 사진=지커믹스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예고했던 최첨단 로보택시가 고작 ‘차 문’ 하나 때문에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서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Waymo)가 운영하는 로보택시가 그 주인공이다. 승객이 하차한 뒤 문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차량이 안전 시스템상 주행을 재개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달려가 문을 닫아주는 웃지 못할 신종 직업까지 생겨났다.
문 닫아주면 3만원 쏠쏠한 부업의 등장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는 웨이모 차량의 열린 문을 대신 닫아주는 작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웨이모 차량은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문이 덜 닫히는 등의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결국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서 “오른쪽 뒷문을 닫아주세요”라는 안내 방송만 반복하게 된다.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2021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승인이 났던 웨이모 로보택시 / 사진=웨이모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웨이모 측은 ‘혼크(Honk)’라는 앱을 통해 현장 대응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작업자가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문을 닫아주면 건당 약 20달러에서 24달러(한화 약 2만 7000원~3만 2000원)를 지급받는다.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만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현지에서는 이색 부업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잉글우드에서 견인업체를 운영하는 한 남성은 일주일에 3건 정도의 문 닫기 작업을 수행한다며, 관련 영상을 틱톡에 올려 4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첨단 기술의 역설 사람 손길 여전히 필요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견인업계 관계자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웨이모 측이 제공하는 차량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현장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연료비와 인건비를 제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견인업체 관계자는 “통상적인 견인 비용인 250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80달러 수준으로는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웨이모의 요청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웨이모 로보택시 / 사진=웨이모
학계 전문가들은 인간에게 문 닫기와 같은 단순 작업을 맡기는 구조는 자율주행 기업에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존 승차 공유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 절감이 필수적인데, 사소한 오류 해결을 위해 건당 수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을 활용해 도로 위 멈춘 로보택시를 관리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슬라이딩 도어 등 하드웨어 개선 시급
웨이모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량 하드웨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는 재규어 I-PACE 모델의 수동 개폐 도어 대신,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와 협력하여 슬라이딩 방식의 자동문을 장착한 신형 로보택시를 개발 중이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슬라이딩 도어가 도입되면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운행 중단 사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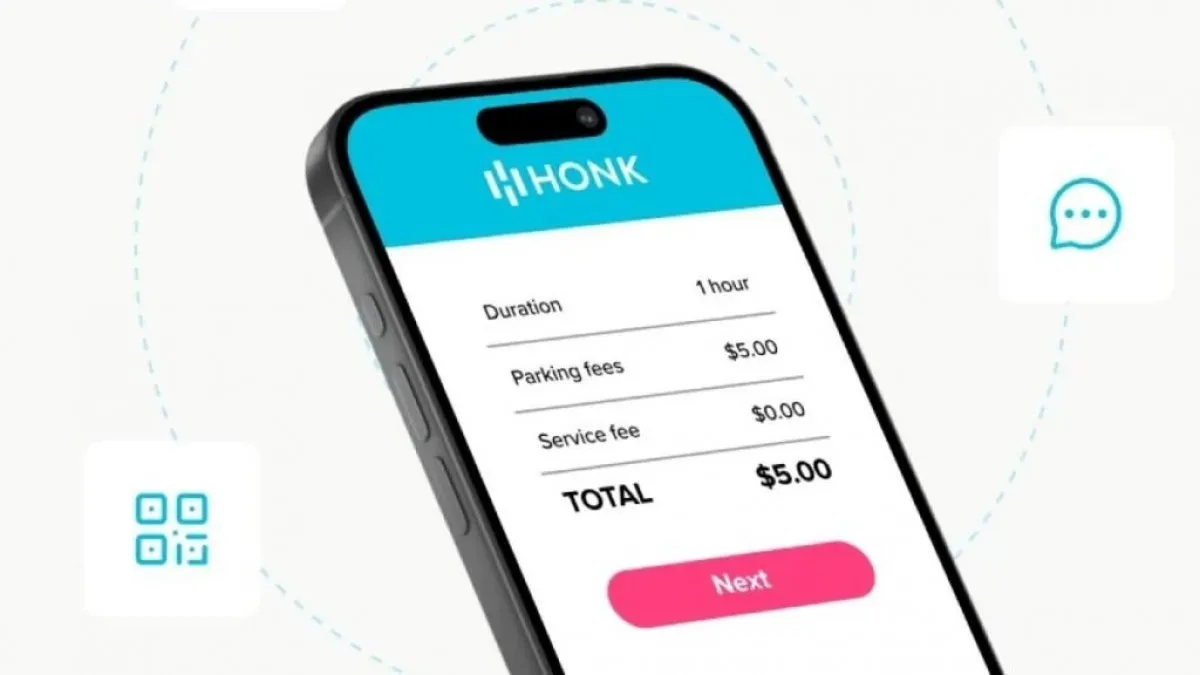
혼크(Honk) 앱 / 사진=혼크
날씨와 재난 앞에서도 속수무책
문 닫기 문제 외에도 웨이모는 기상 악화나 전력 공급 중단 같은 돌발 상황 대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당시 신호등이 꺼지자 로보택시들이 교차로에 멈춰 서며 교통 마비를 가중시켰고, 홍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아예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는 자율주행 AI가 학습하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LA, 피닉스 등 미국 내 5개 도시에서 주간 15만 건 이상의 유료 운행을 기록하며 자율주행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문 하나를 닫기 위해 사람이 출동해야 하는 현실은 자율주행 기술이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 로보택시가 운전자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기계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노동을 창출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종학 기자 fivejh@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