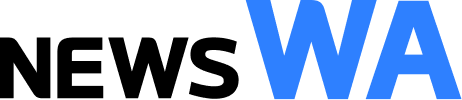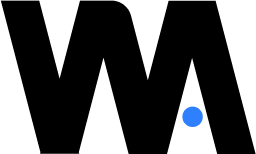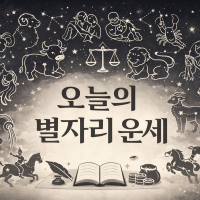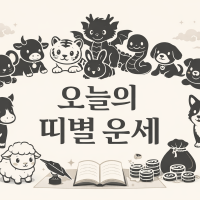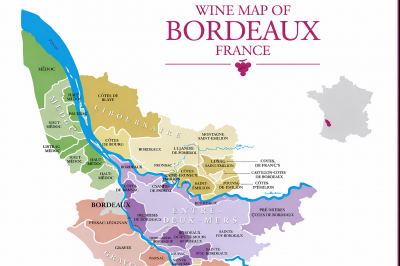‘전기차 올인’ 2년 만의 선회… 美 관세장벽 넘기 위한 하이브리드 대관식, 그 뒤에 숨은 치밀한 계산
불과 2년 전 ‘전기차 올인’을 선언했던 현대자동차그룹이 디젤 엔진 단종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해체했던 엔진설계실을 부활시켰다. 이 모순된 행보는 후퇴가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현실을 직시한 대담한 전략적 선회다. 특히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을 ‘하이브리드’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로 넘어서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 그 중심에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HMGMA에서 생산된 아이오닉 5 차량에 기념 서명을 하고 있다.(출처=현대차)
굿바이 디젤, 33년 역사의 종언
현대차그룹 파워트레인 대전략의 첫 번째 막은 ‘디젤과의 작별’이다. 이달을 끝으로 현대 투싼과 기아 카니발의 디젤 모델 국내 생산이 중단된다. 이로써 국산 승용차 라인업에서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사실상 기아 쏘렌토가 유일하게 남게 됐다. 이는 강화된 환경 규제와 국내 시장의 급격한 디젤 수요 감소에 따른 결정으로, 33년간 이어져 온 국산 승용 디젤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현대 투싼 하이브리드 (출처=현대차)
왕좌에 오르는 하이브리드, 美 관세장벽 넘는 ‘신의 한 수’
디젤이 사라진 빈자리는 하이브리드가 완벽하게 대체한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전년 대비 최대 67%까지 폭증한 반면, 전기차 판매는 정체 상태다. 현대차는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하고 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측정면 (출처=현대차)

현대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실내 (출처=현대차)
예상 밖의 귀환, 200명 엔진설계실의 부활
이번 전략 선회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엔진설계실의 부활’이다. 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캐즘’ 현상과, 예상보다 대폭 완화된 유럽의 ‘유로 7’ 배출가스 규제라는 현실을 직시한 결과다.
현대차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출처=현대차그룹)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측정면2 (출처=현대차)
결국 디젤 단종과 엔진팀의 부활, 그리고 하이브리드 대관식이라는 세 가지 퍼즐 조각은, ‘미국 시장에서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현대차의 정교한 전략적 포석이다. 이는 후퇴가 아닌,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진화다.
이석호 기자 shlee@news-wa.com